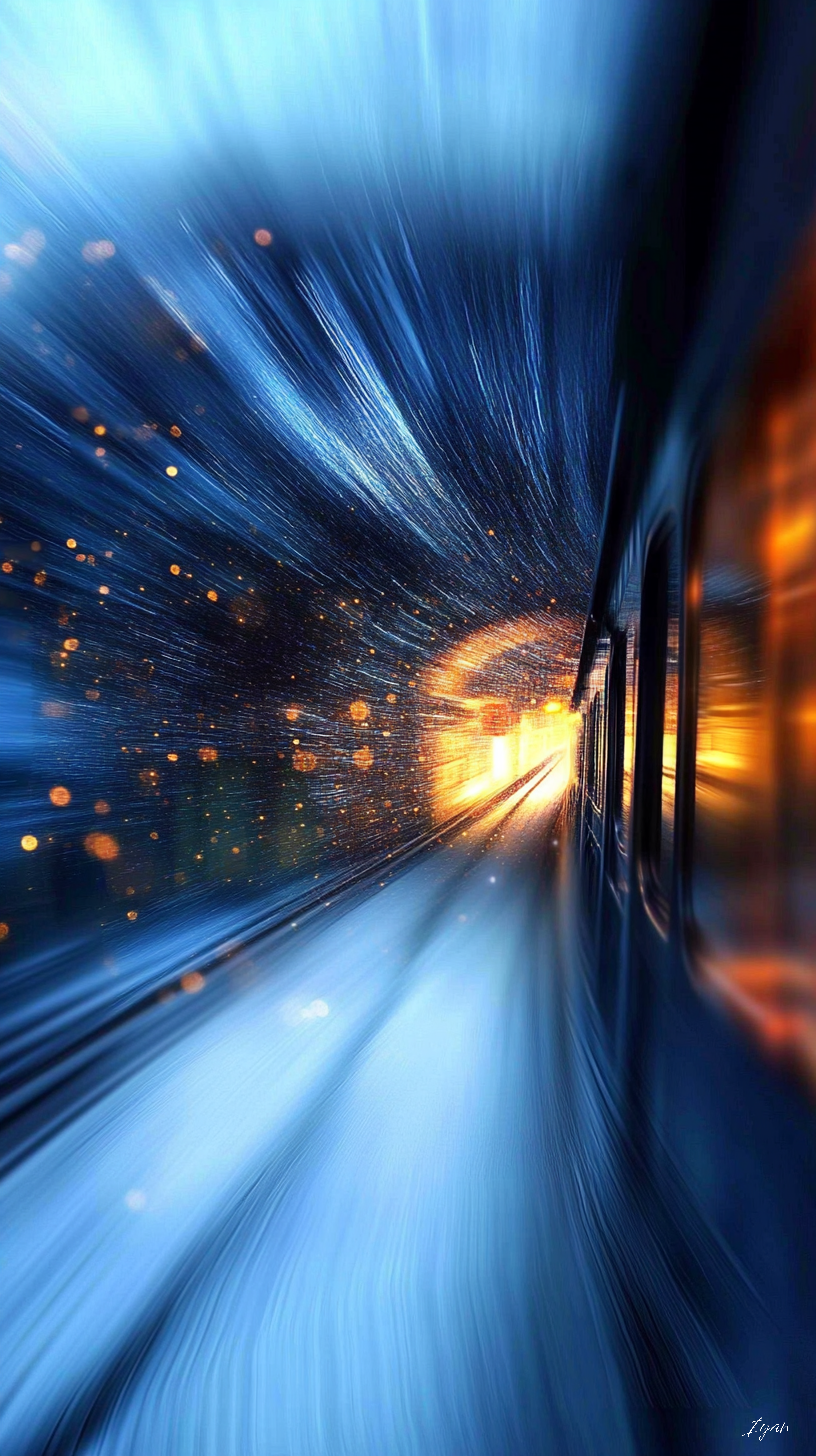먼 언덕 너머로,
기차는 천천히 그림자를 끌고 갔다.
철길은 말이 없었지만,
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삼켰는지는
오직 남겨진 이들만이 알리라.
레일 끝에 스미는 햇살은
금이 간 유리처럼 깨어지고,
하얗게 쏟아진 눈발은
마치 잃어버린 약속처럼 빗겨 흩어진다.
두근거림은 침목 사이에 숨죽이고
멀어진 거리는 두 손 가득 공허로 채워진다.
그리움은 자라난다.
멀어진 만큼, 아니 그보다 더 길게.
덩굴처럼 얽히며 가슴 속에 뿌리내린다.
가끔은 스스로조차 깜빡할 만큼
그렇게 깊이, 은밀히.
지나온 시간 뒤에 남겨진 건
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허공이다.
기차가 떠난 자리,
차가운 레일 위를 비추는 저녁빛은
단 한 번도 돌아본 적 없는
그리움의 등을 어루만진다.
노을은 방금 떠나온 길을
자꾸만 뒤돌아본다.
마치 이제라도 붙잡을 수 있을 것처럼.
그러나 붙잡힌 건 다만 흔적뿐이다.
아직 식지 않은 발자국 위로
겨울의 바람이 천천히 내려앉는다.
돌아보지 않으려 애써보지만
그럴수록 더 아득해지는,
머리끝까지 차오르는 이 몹쓸 그리움.
그리하여,
결국은 스스로를 삼키고야 마는 밤의 기차.
그날 저녁하늘은 농익은 빛으로 물들었다.
노을은 지나온 시간을 닦아내듯
붉은 손길을 내밀었지만,
무엇 하나 온전히 가져가지 못했다.
기차가 지나간 빈 선로처럼,
떠난 이의 뒷모습처럼,
모든 것은 그리움이 되는 시간이었다.
그리운 것은 멀어질수록 가까워지고,
멀리 두려 했던 마음은
눈앞까지 다가오고야 만다.
다가온 뒤에는 다시 떠밀려가고,
떠밀린 뒤에는 다시 그 자리에 다가온다.
모진 이별이 끝난 자리에는
덩그러니 한 조각의 그리움이 남는다.
그리움은 소리 없이 불어오는 바람처럼,
온전히 붙잡을 수도,
온전히 흘려보낼 수도 없었다.